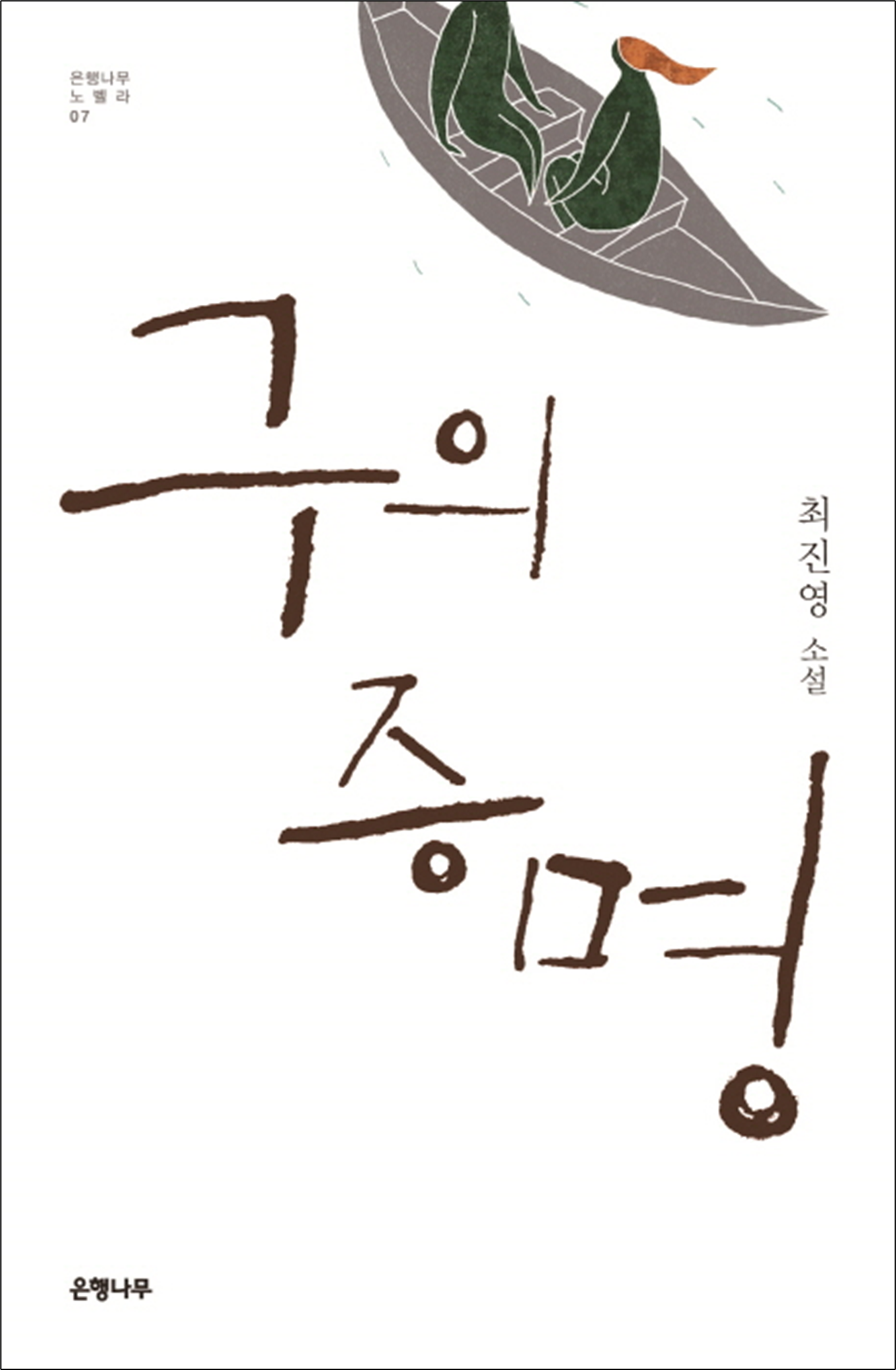
내가 죽기 전에 왔어야 했다. 내가 그것을 바랐다는 걸 죽는 순간에야 알았다.
너를 보고 싶었다.
낡고 깨진 공중전화부스가 아니라, 닳고 더러운 보도블록 틈새에 핀 잡초가 아니라, 부옇고 붉은 밤하늘이나 머나먼 곳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를 바라보다 죽고 싶었다. 너는 알까?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모를까? 네가 모른다면 나는 너무 서럽다. 죽음보다 서럽다. 너를 보지 못하고 너를 생각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다. 내가 본 마지막 세상은 너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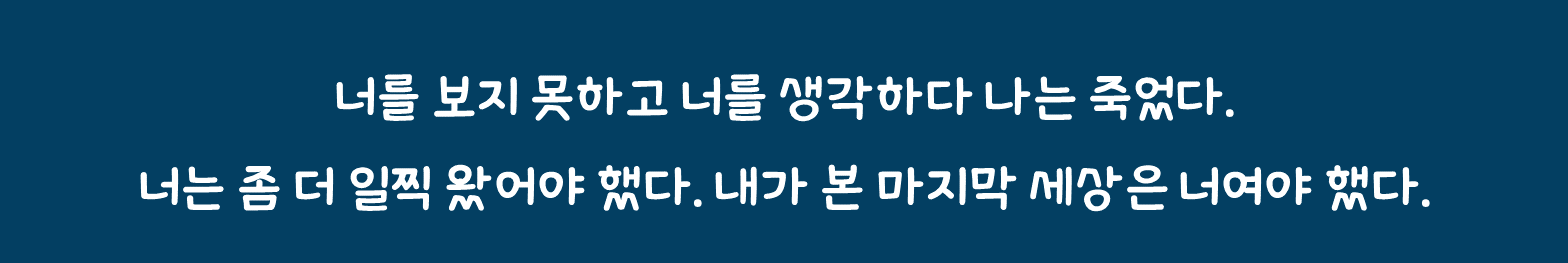

함께 하던 어느 날 구와 나 사이에 끈기 있고 질펀한 감정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메워주는 퍼즐처럼, 뼈와 뼈 사이의 연골처럼, 그것은 아주 서서히 자라며 구와 나의 모나고 모자란 부분에 제 몸을 맞춰가다 어느 날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다. 딱 맞아떨어지며 그런 소리를 낸 것이다.
너와 나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네.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하겠네.

그때 마침 누나가 내 앞에 있었다. 아니, 누나가 내 앞에 있어서 그러고 싶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참기 싫다고. 참는 게, 싫어졌다고,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뭘 알겠느냐고.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근데 여긴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 아닌 세상 아니냐고, 나보다 오래 살았지만 어른 같지는 않은 누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버렸다.


몸뚱이…… 몸은 인격이 아니었다. 사람이라는 고기, 사람이라는 물건, 사람이라는 도구.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영혼 값은 달랐다. 돈 없는 자의 영혼을 깎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없으므로 깎이고 깎인 그것을 채우기 위해 돈에 매달리고, 매달리다 보면 더욱 깎이고…… 뭔가 이상하지만,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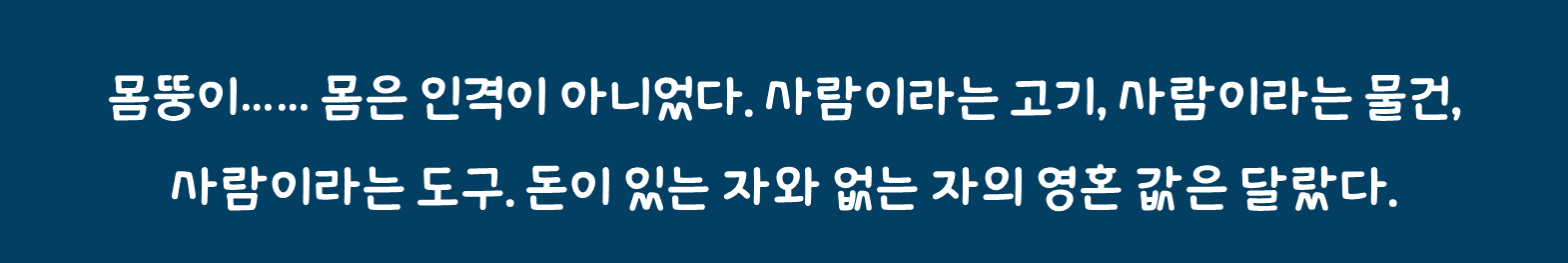
나는 내가, 너를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앞으로도 쭉 안 될 것 같잖아.
구의 목소리는 냉랭했지만 구의 눈동자는 버려진 아이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네가 있든 없든 나는 어차피 외롭고 불행해.
나는 고집스럽게 대꾸했다.
행복하자고 같이 있자는 게 아니야. 불행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있자는 거지.



'책 한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돈내산 BOOK리뷰] #052 밝은 밤 (0) | 2022.04.09 |
|---|---|
| [내돈내산 BOOK리뷰] #051 지구 끝의 온실 (0) | 2022.04.08 |
| [내돈내산 BOOK리뷰] #049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0) | 2022.03.25 |
| [내돈내산 BOOK리뷰] #048 딜레마 (0) | 2022.03.18 |
| [내돈내산 BOOK리뷰] #047 브링 미 백 (0) | 2022.03.12 |